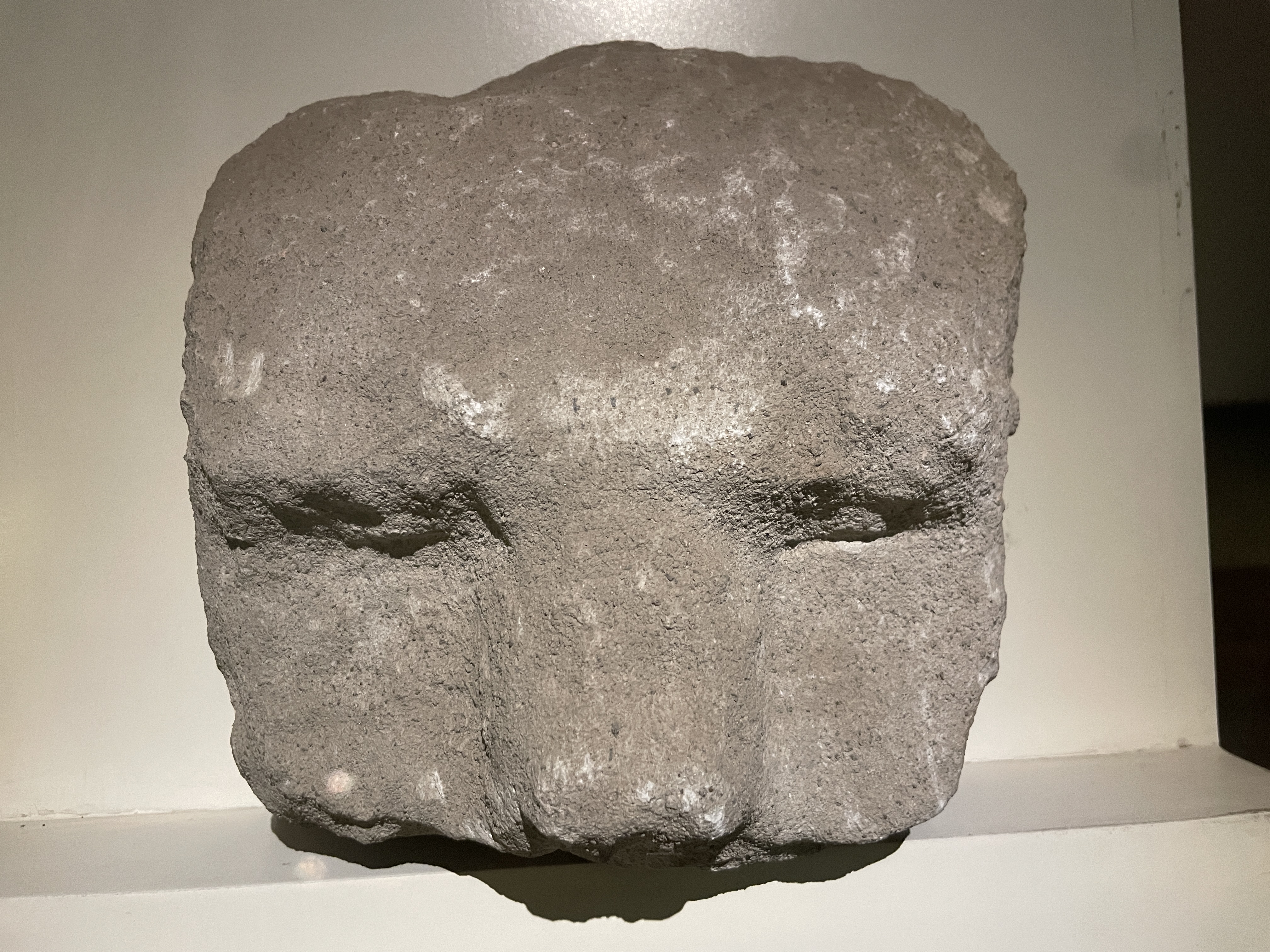쉬운 선택 -박원주- 일상이면 지루하고, 아니면 힘들겠지? 일상이면 평온하고, 아니면 모험이겠지? 그래. 생각 한끗 차이로 결론이 확 다르지. 시련이라 생각하면 엄청났던 인생의 파도가 모험이라 생각하면 스릴있는 서핑이 되지. 역경이라 생각하면 힘들었던 스트레스 압력이 도전이라 생각하면 보석이 되는 과정이 되지.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하지만 생각만큼 바꾸기 쉬운게 없지. 선택은 현실보다 바꾸기 쉬우니까. 그래서 행복은 현실이 아니라 선택이라 하지. 자~ 앞에 쉬운 선택이 놓여있으니 쉬운 선택을 고르는 게임을 시작해 볼까? 골라봐~! * 목사님의 행복한 사람(신33:29) 설교를 듣고 일련의 일들(퇴사, 행사, 조사)을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의 모험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